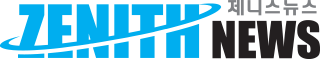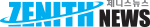[제니스뉴스=권구현 기자] 영화 ‘PMC: 더 벙커’는 기존 한국영화에서 보기 힘들었던 장르다. 대사 대부분이 영어로 돼있고, 촬영부터 CG까지 마치 FPS 게임을 하는 듯한 연출을 가미했다. 장소 역시 DMZ 안 벙커로 제한됐고,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는 인물 또한 한정적이다.
이선균은 이번 ‘PMC: 더 벙커’에서 북한측 의사 윤지의를 연기했다. ‘PMC: 더 벙커’는 ‘에이햅’(하정우 분)의 갈등과 선택 위주로 흘러가는 작품이다. 같은 주연이지만 윤지의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선균의 윤지의는 큰 의미가 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남과 북이 나뉘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촌극의 현장이다. 하지만 윤지의는 국경을 넘어 의사의 본분을 다한다. 그간 우리나라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북한 캐릭터의 모습이다. 이선균이 윤지의에 끌렸던 지점이다.
‘PMC: 더 벙커’의 윤지의로 활약한 이선균과 제니스뉴스가 최근 서울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대한민국 최고의 꿀성대에 녹아났던 시간을 이 자리에 펼친다.

완성된 영화를 본 소감은 어떤지?
아쉬운 면은 아쉽다. 하지만 장점은 분명히 있다. 보지 못했던 장르를 만들어 냈다. 기술적으로도 진일보 했다. 분명 우리 영화엔 압도적인 부분은 있다.
배우 이선균의 필모에 이정도의 CG가 쓰인 작품은 없었던 것 같다. 분명 새로운 도전이다.
맞다. CG도 그렇고, 이런 스타일의 장르 영화를 해본 적이 없다. 완성본을 봤을 때, 공간이 확장되고 깊어진 게 참 신기했다. 시나리오만 봤을 땐 그 공간이 이해가 다 안 됐었다. 시나리오 설계가 워낙 촘촘하고 겹겹으로 쌓여있던 것도 이유가 됐다. 한마디로 편하게 술술 읽혔던 시나리오는 아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 싶었다.
겹겹이 쌓아놓는 구조는 이젠 김병우 감독의 특유의 화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 실제로는 어땠을까?
좋았다. 일단 화법은 일반적이진 않다. 대화가 쌓이질 않는다. 하지만 전 그게 편하고 좋았다. 귀엽게 느껴질 때도 있다. 차갑고, 시크하고, 시니컬한데,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이다.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다.
영화로 이야기하자면,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만드는 것이 많지 않다. 사전 설계도가 딱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다. ‘더 테러 라이브’에 이어 이번 ‘PMC: 더 벙커’까지, 분명 김병우의 영화 화법은 이어지는 것 같다.
‘윤지의’라는 역할은 어떤 느낌으로 마주했을까? 영화 전체의 흐름은 ‘에이햅’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PMC: 더 벙커’는 에이햅의 갈등과 선택이 주가 되는 작품이다. 기능적으로 보자면 윤지의는 그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키와 같다. 그리고 윤지의라는 사람을 보자면 보통 우리 영화에서 북한 캐릭터는 군인이 많다. 그리고 정치적 이념을 강조하는 캐릭터가 많다. 하지만 윤지의는 반대로 사람 목숨을 중히 여기는 의사라는 게 참 신기했다. "사람 살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네?” 같은 대사가 윤지의를 나타내는 것 같다. 이념보다 신념이 앞서는 것이다.

제작진이 5년 동안 준비한 작품이다. 그렇다 보니 하정우를 비롯 다른 스태프에 비해 늦게 합류했다. 부담도 됐을 거다.
제가 극을 이끌고 가는 롤이 아니라는 게 다행이었다. 더 큰 주인공 위치였다면 아마 부담돼서 못했을 거다. 이미 상은 잘 차려져 있었다. 전 밥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다. 국제 학교로 전학 간 기분이었던 것 같다. 일단 제가 너무 함께 해보고 싶었던 스태프로 구성돼 있었다. 이번에 거절하면 기회가 다시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지만, 비슷한 또래들끼리 모여 작업한 것도 처음이었다. 아침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촬영하는, 마치 대학교 때 같았다.
분위기가 좋았던 건 확실하다. 과거 하정우 씨가 말하길, “이전에 내 마음 속 연예계 음주 1등 선수는 조진웅이었다. 하지만 이젠 이선균이 1등 선수다”라고 했다.
연예계 음주 1등 선수…,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다. 하하. 사실 ‘끝까지 한다’를 할 때 진웅이나 저나 촬영 전에 서로 “엄청 마신다던데?”라는 말을 들은 상황이었다. 주량만 본다면 비슷하다. 다만 진웅이는 연타가 가능하다. 전 퐁당퐁당으로 가야 한다. 제가 오래 마신다는 말을 정우가 했다던데, 그건 정우가 밤 12시 땡 치면 집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다.
하지만 막상 하정우 씨와 함께 하는 신은 많지 않다. 대화 역시 캠을 통해 하는 것이 대다수다.
하하. 정우가 먼저 다 찍어서, 그걸 보고 하정우의 행동에 맞게 따라갔다. 제가 현장에 들어갔을 땐 다들 없었다. 현장에 나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 뭐랄까? 전학생이 혼자 나머지 공부하는 느낌이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액션과 리액션을 받아서 연기하는 지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직접 촬영을 하며 연기를 하기도 했다. 이 또한 새로운 경험이자 어려운 지점이었을 터다.
타이트한 건 제가 다 찍었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 한쪽 팔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 꽤 불편했다. 그렇게 촬영을 하면, 그걸 모니터링 해서 또 다른 촬영 디렉션을 받았다. 무엇보다 가까이에 있는 카메라 렌즈를 보고 연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리고 광각이다 보니 얼굴이 왜곡돼 보일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었다.

영화의 대부분이 실내촬영이었다.
마지막 엔딩에 갈대밭을 가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했다. 마치 첫 촬영을 시작하는 것 같았다. 우리끼리 “이제야 영화 찍는 거 같다”는 말을 했다.
북한 사투리도 고생이었을 거다. 그럼에도 대사가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어 아쉬웠다.
북한말이 우리 쪽 보다 호전적이고 강하다. 대본에 워딩으로 보면 더 호전적이라, 이걸 언밸런스하게 표현하면 더 부각될 거 같았다. 그래서 후시녹음 때도 더 많이 눌러서 표현했다. 교감하는 부분에선 더 편한 느낌으로 갔던 것 같다.
대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는 신은 정말 고민이 많았다. ‘대사를 앞세우냐, 상황을 앞세우냐’였다. 어차피 후시 녹음이니 조절하면 그만이었다. 제 생각엔 분명 말이 나올 것 같았다. 상황은 표정이나 호흡에서 드러난다는 생각이었다. 지적을 받게 된다면 제가 받기에 더 그랬다. 하지만 결국 감독님께 설득 당했다.
확실히 'PMC: 더 벙커'는 연출, 촬영, CG가 세련됐다. 할리우드 영화 같다는 느낌을 준다. 대사의 대부분이 영어라 더 그렇다.
할리우드 영화 같다는 건 장점이자 단점이다. 자본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 영화 치고는 버젯이 크지만, 할리우드에 비하면 독립영화 수준이다. 정말 엄청난 퀄리티인 거다. 사실 요즘 관객들에겐 플랫폼이 많이 늘어났다.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그 예다. 그래서 극장에선 큰 스케일의 영화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극장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이기 때문이다. 마블 영화가 잘 되는 이유도 그런 거 같다. 일단 저희 영화는 그런 지점을 충족 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
사진=CJ엔터테인먼트
저작권자 © 제니스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