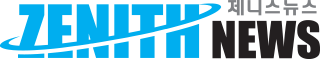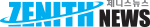[제니스뉴스=권구현 기자] ‘사슴 눈망울’이 이럴까. 배우 수애의 이야기다. 그 큰 눈으로 눈물을 떨굴 때면 그를 보는 관객들도 함께 눈물을 흘린다. 큐 사인과 함께 눈시울을 붉혀 감독과 스태프들에게 “안구건조증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는 그렇게 슬픔의 정서를 훌륭히 전하는 배우다.
영화 ‘국가대표2’에서도 그랬다. 수애가 연기한 리지원은 북한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였지만 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떠나 남한으로 넘어왔다. 그렇게 이별할 수 밖에 없었던 동생(박소담 분)을 두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한의 정서를 품에 안은 채 아이스하키에 매진하는 연기를 펼쳐냈다.
육체와 정신의 극한을 연기한 수애를 제니스뉴스가 만났다. 액션 영화가 아닌데도 누구 보다 몸을 썼어야 하는 연기, 나아가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을 이산 가족의 아픔을 녹여냈어야 하는 수애. 하지만 그가 이야기 하는 ‘국가대표2’의 현장은 힘겨움 보다는 즐거움이 더 많은 촬영장이었다.
아이스하키라 하면 거친 운동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선택하는데 고민도 있었을 것 같다.
‘국가대표’를 엄마랑 함께 봤었는데 엄마가 굉장히 재미있게 보셨다. 그 부분이 이 영화를 선택했던 이유가 되기도 했다. 고생을 즐기는 편이다. 솔직히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수월했던 작품이 없다. 동적인 걸 즐기는 편이다. 저 말고도 이번 영화를 하면서 모든 배우가 타박상은 다 가지고 시작했다. 새끼 발톱이 빠지긴 했는데, 오롯이 촬영 때문은 아니었다. 하지만 처음 경험해봤다. 공항 질주신 이후에 집에 가니 발톱이 아팠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잤는데, 확인해보니 발톱이 빠져있더라. 그날 재촬영을 하는데 다쳤단 말을 못했다.
본래 여성 아이스하키에는 없는 ‘보디체크’ 부분이 참 실감나게 살았다. 신의 한 수였다.
‘보디체크’ 는 배우들의 얼굴 표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심리적인 부분이 묘사되는 장면이라 꼭 소화해야 하는 신이었다. 촬영할 땐 늘 감정의 극한에 갔던 것 같다. 늘 한계에 부딪혔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과정보다 오히려 격려해줬던 배우들, 놀았던 기억들이 남아있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배우들 없이 혼자 견뎌내라 했다면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기억만 남을 것 같다. 7명 모두 다 겪은 일이다. 저희가 나눈 일이 많아서 그런지 촬영이 즐거웠다.
배우들끼리 앙상블이 좋았던 걸로 소문이 났다. 사실 여배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사실 ‘기싸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이 있었다. 저도 시나리오에 6명이라는 인원을 보고 기대도 됐지만 걱정도 있었다. 특히 서로의 조화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제가 낯을 가리는 편이다.
그래서 첫 만남이 중요할 거라 생각했다. 사람들은 ‘두 명이 만나도 힘든데 여섯 명이면 얼마나 힘들겠니’라는데 우리는 첫날부터 모든 걸 내려놨다. 갯벌에서 민낯으로 만났다. 진흙을 묻히고 온 몸을 갯벌에 파묻고, 체면치레할 것도 없이 망가졌다. 예쁨과 여배우를 내려놓고 뛰었다. 덕분에 기싸움이란 게 전혀 없었다. 아마 감독님의 전략이었던 것 같다.
대본을 봤을 때부터 힘들 걸 알았지만 정말 그리 심할 줄은 몰랐다. 덕분에 첫 촬영 이후 회식도 하면서 많이 돈독해졌다. 그런데 지금 여배우란 타이틀 달고 홍보에 나선 친구들을 보니 오히려 서로가 낯설다. 다들 너무 예쁘게 마법을 부리고 나타났다.

여배우가 예쁨을 내려놓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니다.
운동영화였고 감히 국가대표 타이틀을 달았다. 그래서 ‘여배우라는 존재가 1초라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누구 하나 예뻐 보이면 안 될 영화였다. 우리 여섯 명이 동네 친구로 나왔다면 이야기가 달랐을 수도 있다. 아마 그 땐 예쁘게 나오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아침에 비비를 발라도 늘 땀 분장으로 지워졌다. 누구 하나 꼼수를 부릴 수 없었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접근했다.
맞다. 말대로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800만 관객을 모은 영화다. 속편의 부담이 없을 수 없었을 거다.
처음엔 ‘국가대표2’가 아닌, ‘아이스호K’라는 스포츠 영화로 시나리오를 받았다. 그래서 처음엔 부담이 없었는데, ‘국가대표2’라는 타이틀로 바꾸게 되면서 부담이 생겨났다. 저 또한 힘든 점을 알고 있었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라는 생각도 있었다. 그 때 생각했던 게 ‘국가대표’를 재미있게 보신 부모님이었다.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았다.
전지훈련 때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다.
일단 엄청 추웠다. 갈남항에서 촬영했는데 가기 전에 이미지 사진을 보여줬다. 그런데 너무 예뻤다.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갔더니 지옥과 같았다. 그래도 고생 했지만 추억도 쌓았다. 달수 오빠 방에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고기도 구워 먹었다. 다 같이 모인 신이었는데 작품과 상관 없이 개인적으로 많이 기억에 남는다. 수학여행 또는 MT 느낌이 났다.
사실 그런 분위기를 많이 기대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많이 열악했다. 낮에 체력 소모가 많아서 그럴 여력이 없었는데, 체력이 되는 친구들, 달수 선배나 연서, 재숙 씨는 함께 했다. 지희는 공부 때문에 빠지고, 슬기는 드라마랑 병행하고 있었다. 물론 예원 씨는 언제나 함께하는 친구였다. 하하.

모든 캐릭터가 다 독특했는데 각 배우들과 비슷한 지점이 있었나?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다. 연서는 터프한데 귀엽다. 재숙 씨도 소심하지 않고 오히려 왈가닥이다. 예원이는 그렇게 재미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진지하다. 반면 슬기가 제일 반전이었다. 리딩 땐 참 똑부러지고 감정에 대해 충실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음도 굉장히 여리고, 호기심도 많고, 이렇게 ‘여자여자’ 하는지 몰랐다고 말할 정도.
오달수 씨는 무려 청일점이었다. 요즘 그런 영화 찾기 힘들다.
달수 선배가 ‘현장이 그립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사실 현장에서 어느 누구와 조화를 이룬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면을 정말 배우고 싶다.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 배려심이 몸 속 깊숙이 있다. 물론 저희가 선배를 잘 따랐지만 저희끼리 이야기할 일이 있을 때는 살짝 비켜주신다. ‘멋있다’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분이다.
오달수 씨 다음 가는 고참 선배였다. 책임감이 있었을 것 같다
처음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만의 역할을 찾아낸 것 같다. 연서가 너무나 유쾌하게 분위기 메이커를 해줬다. 제가 주저할 때 연서가 많이 해줬고, 거기에 공감하는 재숙이도 있었다.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예원도 있고, 묵묵히 응원해주는 슬기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지희도 있었다. 그들 덕분에 부담 없이 촬영을 끝낼 수 있었다.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다 채워줬다. 내가 맏언니로, 선배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사진=하윤서 기자 hays@
저작권자 © 제니스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