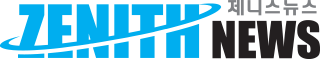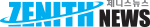[제니스뉴스=부산, 권구현 기자] 부산국제영화제의 매력이라 하면 스크린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배우들을 눈 앞에서 보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해운대의 바다 앞에서 파도소리와 함께 함깨하는 재미가 있다. 제 21회 부산국제영화제엔 한국영화기자협회와 함께하는 오픈토크 ‘더 보이는 인터뷰’로 배우와 감독이 관객들이 만난다. 비록 태풍 차바로 인해 해변의 백사장이 아닌 영화의 전당에서 이뤄졌지만 그 안에 오고가는 이야기는 다를 것이 없었다. ‘오픈토크’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배우 이병헌이었다.

# 모히토 가서 몰디브 한 잔
기본적으로 애드리브를 선호하지는 않는다. 감독의 의도나 결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감독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애드리브를 조심스럽게 하려고 한다.
‘내부자들’ 같은 경우는 모든 캐릭터가 강하고 숨 막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쉼표 같은 쓰임새로 사용했다. 애드리브를 미리 설계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서 리허설을 하다가 상황에 따라 하는 부분이 있다. ‘내부자들’의 모텔신에서 화장실이 통유리로 된 거는 시나리오를 읽을 때 이미 했던 생각이었다. 그래서 디자인에 관해 의견을 냈다. 그런 경우는 이미 설계된 애드리브다. 보통의 애드리브는 현장에서 신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
‘모히토 가서 몰디브 한 잔 한다’는 애드리브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애드리브다. 리허설에서 장난처럼 했는데 잘못하면 이 신이 망가질까 걱정했다. 다행히 웃음은 웃음대로 그 신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감정은 감정대로 잘 전달됐다.

# 믿고 보는 배우 이병헌
믿고 보는 배우라는 건 좋은 말이다. ‘늘 기대되고 믿는다’는 말을 요즘 많이 하는데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매우 기분이 좋다. 얼마나 오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요즘은 ‘믿고 보는 배우’라는 말이 흔해지긴 했지만 그 말처럼 배우로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말도 없는 것 같다. 믿고 보는 배우, 늘 기대되는 배우라는 말은 배우로서 오랫동안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꿈꿔오던 말이다.
# 감성연기는 언제쯤?
사회적인 분위기, 시류에 따라 영화의 장르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범죄영화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관객들이 이런 영화를 보고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느 순간 영화들을 보면 반 이상은 범죄, 스릴러 등이다. ‘내부자들’ 때도 말했지만 ‘내부자들2’를 찍고 싶지 않다. 배우로서는 좋지만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없었으면 한다. 따뜻한 영화,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는 시대가 왔으면 한다. 앞으로 개봉하는 영화 ‘싱글 라이더’는 그런 정서가 있다. 아픈 가슴앓이가 담겨있다.
# 내가 보는 배우 이병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은 아직 없다. 영화를 반복해서 봐도 영화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그 자체로 안 보고 나를 보게 된다. ‘저 땐 왜 이렇게 어설펐지’,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30-40번 영화를 본 적 있다. ‘공동경비구역 JSA’였다. 첫 흥행 영화라서 기쁨이 있어서 그랬다. 30번 넘게 보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한 편의 영화로 보이기 시작했다.

#할리우드
할리우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크게 대답을 한다면 과연 ‘내가 배우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 영화를, 내 연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도전하고 부딪히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희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7년이 됐다. 상상하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영화광이었다. 정말 TV를 볼 수 있는 나이부터 함께 영화를 보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분이 지금 내가 걸어온 길을 보시며 얼마나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실까 생각을 한다. 혼자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지만 나에게 의미가 크다.
#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
첫 번째로 보여주고 싶은 영화는 ‘악마를 보았다’다(웃음). 지금은 TV를 봐도 5분 이상 못 본다. 아직은 이른 것 같다. 이야기를 파악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나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시간만 나면 항상 영화관을 데려갈 것 같다.
# 한국과 할리우드의 차이점
처음에 할리우드 갔을 때는 모니터를 보는 것도 어려웠다. 배우들이 모니터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주로 감독이 판단하기 위해 모니터가 있는 것이고 배우들은 감독이 OK를 하면 납득하고 믿는 분위기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 영화 시스템이 모니터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은 사실이다. 다들 모여 여러 번 확인한다. 그런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다. 그런 것에 익숙한 한국배우가 할리우드에 갔더니 어색함이 있었다. 지금은 익숙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꼭 봐야할 때가 있을 때는 고집을 피운다. 확실히 할리우드에 익숙해진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감독의 스타일이다.
# 인생작
작품 하나 하나가 각기 다른 이유로 가장 소중하다. 굳이 따지자면 ‘달콤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한다. 영화 자체에 애정도 있지만 그 영화를 통해 할리우드에 진출할 수 있었다. 나를 알릴 수 있는 작품이라 고마움이 있다.
사진=부산국제영화제
저작권자 © 제니스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