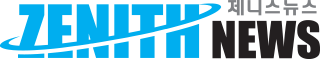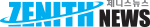[제니스뉴스=권구현 기자] 누구나 예상했던 제 53회 대종상영화제 남우주연상이었다. 하지만 수상 소감은 달랐다. 이병헌은 슬펐고, 대종상은 아팠다.
제 53회 대종상 영화제가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군자동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은 김병찬, 이태임, 공서영의 사회로 진행됐다.
시상식 하루 전인 26일까지도 정확한 참석자가 정해지지 않아 논란을 낳았던 이번 대종상이다. 홍보대사로 황정민과 전지현이 선정됐지만 그들 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출품작도 적었다. 겨우 29편의 작품만이 출품됐다. 2016년 유일한 천만 영화인 ‘부산행’은 물론 해외 각종 영화제에서 호평 받은 ‘아가씨’는 대종상에서 만날 수 없었다.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진행됐던 대종상이었지만 올해는 연말이 돼서야 개최하게 됐다. 또한 KBS 조차 생중계를 고사해 땅에 떨어진 대종상의 위상을 가늠케 했다.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대종상 영화제였다.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조직위도 없고, 영화제를 빛낼 배우들도 없고, 영화제의 주인공인 작품도 없었다. 하지만 역사와 전통을 위해 명맥을 이어야 한다는 명분 아래 53번째 대종상 영화제가 열렸다.
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부문이 대리 수상으로 진행됐다. ‘덕혜옹주’의 프로듀서는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의상상, 음악상을 수상하러 네 번이나 무대에 올랐다. ‘곡성’의 아역 배우 김환희 또한 자신이 수상한 신인여우상 외에 편집상과 조명상, 촬영상을 대리 수상했다.
진행도 미숙했다. 시상자들의 호흡은 어색했고, 특히 예기치 않게 무대 위에 오른 김환희에게 대본에 없었던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행사 시간을 안배한 인터뷰였지만 돌발상황에 마주하는 어린 김환희에 대한 배려가 아쉬운 대목이었다.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한 김환희가 대견해지는 순간이었다.
나아가 시나리오상을 수상하는 ‘내부자들’의 우민호 감독을 “우민호 작가”라 호명했으며, 감독상으로 무대에 오르는 우민호 감독을 두고 “감독은 불참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상을 받는 배우들도 불참했던 시상식이기에 가장 긴장감이 있어야 할 수상자 호명은 김이 빠졌다. 특히 남우주연상이 그 정점을 찍었다. 영화제가 열리기 전부터 이병헌의 참석 여부가 화제가 됐던 바 이병헌의 남우주연상 수상은 기정사실과 다름없었다. 남우주연상 후보 중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에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제 53회 대종상 영화제의 남우주연상 수상자였다.
하지만 무대에 오른 이병헌의 수상 소감은 달랐다. 물론 이병헌이라는 배우의 무게와 어수선한 시국과 닮아 있는 영화 ‘내부자들’이었기에 이날 행사의 여타 수상소감과는 다를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다. 그러나 이병헌이 언급한 것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대종상을 향한 애정과 조언이었다.
이병헌은 수상의 기쁨 보다는 다소 착잡한 표정으로 “제가 대종상을 처음 받은 게 20년 전쯤 신인상으로 무대에 올랐다”는 말로 수상 소감을 열었다.
이어 “오늘 시상식에 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상을 받은 기쁨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대종상이 그 동안 말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다.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느낌이 있다. 모두가 느낄 거다. 53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 그 명예를 다시 찾는 게 단시간에 일어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대종상의 현실을 언급했다.
나아가 “하지만 53년간 명맥을 유지해온 시상식이 불명예스럽게 없어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저도 어느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변화라는 건 개인의 의지가 아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고민하고 노력해야 시작된다고 생각된다. 제가 20년 전에 이 자리에 올 때 설렜??마음으로 후배들이 이 시상식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본다. 저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 선배들이 이 영화제를 만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후배들이 지켜나가야 할 것 같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병헌의 마음은 최우수상작품상을 수상한 ‘내부자들’에게 이어졌다. ‘내부자들’의 김원국 대표는 “중학교 때 대한극장에 갈 때 마다 충무로역에 벽에 붙어 있는 대종상 사진을 보곤 했다. 제가 좋아하는 유시민 작가님이 토론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 ‘사람도 나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면 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다’고 했다. 대종상과 대한민국도 하루 빨리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새롭게 태어나겠다”라고 천명한 제 53회 대종상 영화제는 많은 숙제를 안고 막을 내렸다. 역사와 전통의 대종상이 이런 현실에 놓인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원인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상 시상에 나선 지상학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은 언론을 향해 “대종상이 많이 아팠다”면서, “이유가 있었지만 환자가 반성하고 있으니 상처를 건드려서 회복 불능을 만들기 보다는 상처를 어루만지고 보듬어주고 소독도 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부탁했다.
이병헌의 소감처럼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가 아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53년 대종상의 명맥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그 시발점은 당연히 대종상 영화제가 돼야 할 터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어루만지고 보듬기만 한다면 곪아터질 것이 자명하다. 소독으로 낫지 않는다면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
내년을 예고한 대종상이다. 53회 대종상 영화제를 지켜본 대중들이 과연 내년 영화제에 어떤 기대를 할까? 치료해달라고 투정부릴 일이 아니다. 환자의 의지 없이는 그 어떤 명의도 병을 고칠 수 없다.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 환자의 가족도 지쳐가는 법이다. 대종상의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영화인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 텅 비어버린 병실이 그 방증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관심과 애정이 이병헌의 수상 소감이라는 걸, 주최 측은 명심 또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진=하윤서 기자 hays@
저작권자 © 제니스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