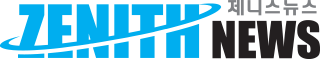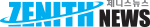[제니스뉴스=권구현 기자] 특이한 팔찌를 차고 있기에 의미를 물었다. 질문을 받은 강하늘은 반짝거리는 눈과 함께 “이거 각인 팔찌에요”라며 팔찌에 새겨진 문구를 보여줬다. ‘今、私が与える意味以外の意味は存在しない - 지금, 내가 부여하는 의미 말고 다른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글로 닐 도널드 월쉬의 ‘신이 말해 준 것’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라고 했다.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책을 읽었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충무로의 미담제조기로 매일을 살고, 타인에게 찡그림 보다는 미소를 먼저 안기는 강하늘이다.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가사가 누구보다 어울리는 배우였기에 그가 느꼈을 고민의 깊이가 가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의 필모를 더듬어보면 쉬운 길을 가는 배우는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동주’도 그랬고, 이번 ‘재심’도 그랬다. 실존 혹은 실재하는 인물을 본인 안으로 가져와 관객에게 전하는 과정이 순탄할 리 없었다. 그러나 그 진심은 통했고 관객은 강하늘을 통해 ‘재심’의 현우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만나고 있다. 최근 서울 삼청동에서 제니스뉴스가 만났던 강하늘과의 대화를 이 자리에 전한다.

‘재심’의 캐스팅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정우와 강하늘의 역할이 뒤바뀐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안 그래도 정우 형이 “우리 역할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었다. 우리 영화에 더 재미있을 지점이 된 것 같다.
그렇게 결국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양아치 비주얼을 탄생시켰다.
일반적인 그림을 배제하고 싶었다. 착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억울해 하는 모습을 지양하고 싶었다. 그런 작품은 외국 영화에도 많았다. 그런 영화를 볼 때 마다 ‘저렇게 착한데 왜 누명을 써?’라고 생각 했다.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이미지여야 누명도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원래 장발로만 그려져 있던 현우에 브릿지도 추가했고, 문신도 원래 한 개였는데 더 추가했다. 그리고 과거의 현우는 전부 노메이크업으로 촬영했다. 어딘가 찌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태닝까지도 생각했는데, 현재와 과거를 왔다갔다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참았다.
유독 실화 영화, 나아가 실존 인물을 연기했다.
제가 실화-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쎄시봉’ ‘동주’ ‘재심’, 세 작품 정도 되는 거 같다.
아니다. ‘평양성’의 ‘남산’도 있다.
맞다. 네 작품이다. 솔직히 말해 ‘동주’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던 작품이다. ‘윤동주’라는 인물이 지금 계시지 않으니 제가 그분을 대변한다는 느낌이 있었다. 행동 하나하나가 윤동주처럼 비춰져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실화를 여러 번 연기했지만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실화를 극화하는 거다. 그래서 실화 속에 제 감정이 부딪히면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실화 속 인물 보다는 시나리오에 그려져 있는 인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실화와 떨어져서, 시나리오 안에서의 ‘현우’는 어떻게 만들어갔을까?
누구나 그렇듯 ‘만약에 나라면?’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했다. 현우의 상황은 제가 저항하기엔 정말 너무 큰 압력이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했을 시간이었을 것 같다. 하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영화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제 행동과 그 분의 행동도 다르고, 그 분이 사는 집도 영화와 다르고, 어머니와 그 분의 관계도 다르다. 실제 만나 봤던 그분의 느낌도 그랬다. 외모부터 달랐다. 실제로는 풍채가 큰 분이셨다. 물리적인 부분부터 저와 그분은 달랐다.
그래서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었다. 누군가는 무책임하다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 연기자다. 메시지는 시나리오에 담겨 있고, 전 그 시나리오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물론 저도 실존 인물에 대한 개인 감정이 있다. 안타깝기도 하고 앞으로의 일이 잘 풀리길 바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영화가 아닌 현실에 남겨놓고 싶다.
시나리오의 현우는 작품 속에 잘 녹아났다고 보는지?
본 시나리오보다 영화가 많이 컴팩트해졌다. 제가 교도소 안에서 이 사건에 대한 공부를 하던 내용 같은 것이 빠졌다. 또 사건의 퍼즐을 맞춰가면서 디테일한 지점들이 빠졌다. 영화가 가고자 하는 이야기의 방향에 대한 정리였던 것 같다. 철저하게 감독님을 믿는 지점이다.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우리 영화가 추리극으로 가는 것에 대한 경계였다. 수사를 따라가느냐, 사람의 감정을 따라가느냐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그런 산만한 지점들이 잘 정리가 됐다.
사진=오퍼스픽쳐스
저작권자 © 제니스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