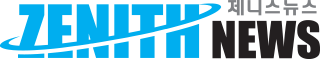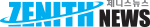[제니스뉴스=최민지 기자] 배우 김강우(37)는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영화 ‘간신’(민규동 감독, 수필름 제작)은 독보적이다. 무려 연산군이다. 어느 누가 해도 평균 이상은 해내고야 만다는 역할. 그래서 걱정도 고뇌도 많았다. 하지만 김강우가 연기한 연산군은 엄청난 괴력을 뿜어낸다. ‘김강우가 이제야 제대로 물 만났다’는 말이 어색하지가 않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정답 중의 정답이다.
김강우는 ‘간신에서’ 연산군으로 출연한다. 연산군은 역사에 폭군으로 기록된 인물로 수많은 드라마에서도 다루어졌던 인물이다. 김강우가 그려낸 연산군은 난폭하지만 내면에 아주 악독한 슬픔을 갖고 있다. 그 초롱초롱한 눈동자에 눈망울이 맺히고, 슬픈 미소가 얼굴에 녹아들면 보호본능이 발동된다. 간신 임숭재(주지훈)에게 한없이 휘둘리다 철저한 외톨이가 되는 연산군. 김강우가 제대로 연기를 만났다.
다음은 김강우와의 일문일답이다.
- 연산군이 참 외롭게 그려졌다.
“철저하게 외로워 보이려 했다. 스스로 왕따를 자청했다. 그래야 될 것 같았다. 사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었다. 준비를 해 간 에너지를 촬영장에도 모두 쏟았기 때문이다.”
- 인생 연기라는 평가도 있다.
“사실 남다르지 않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드라마틱해 표현할 것들이 많았을 뿐이다. 실존 인물이라는 부담감은 있었다. 중도를 지키려는 부담감 말이다. 역사에는 미친 사람으로 표현됐지만 끼를 100%, 1000% 이상 보여줬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연산군이 처용무를 추면 여자가 모두 울었다고 한다. ‘왜 하필 그 때 왕으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다.”

- 연산군은 노림수였나.
“연기 경력 13~14년 차가 되면 어떤 작품, 어떤 역할에 주목을 받는지 다 안다. 하지만 기다리고 묵혀서 그것만 찾아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산군이라는 역할이 내게 왔을 때 좋기도 했지만 ‘좀 더 무르익은 다음에 가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소중했고, 그렇기 때문에 파고들 수밖에 없었다.”
- 감정을 어떻게 조절했는지.
“화와 광기, 이걸 명확하게 표현해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정의 라인을 계산했다. 이성적으로 감성을 누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가야했다. 어느 순간 이성이나 감정이 앞서는 순간이 있는데 그걸 계산하는 즉시 지는 거다. 진부한 현장에 나가면서 모든 마음을 버렸다. 엄청난 몰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끈을 놓아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썼다.”
- 어떤 장면이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현장에도 변수는 생긴다. 임숭재에게 갑자기 머리를 조아리며 죽여 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옷을 찢고 임숭재에게 다가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대사와 연기가 맞닿는 순간이 있더라. 연산군이 우니 갑자기 임숭재도 울더라. 어느 순간에는 선을 정말 잘 타줘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확 놔버려야 되고. 그게 바로 연기인 것 같다.”
- 빨간 점은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촬영 들어가기 며칠 전에 확정이 됐다. 연산군에게는 태생적인 결함, 결핍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 스톱을 못할 정도로 미쳐가는 모습에 설득력이 생길 것 같았다. 비주얼 적으로 등장부터 결핍이 보였으면 했다. 자신이 사냥을 나갈 때 누군가가 쳐다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얼굴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왕에게 상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나.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붉은 점이었다. 처음에는 티도 많이 나고 해 그리는 게 쉽지 만은 않았다.”

- 현장에서는 어땠나.
“현장에 따라 역할이 좀 바뀐다. 주지훈 씨는 기본 성향이 수다스럽고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난 금방 에너지가 빠지는 스타일이라 겁이 나서 말을 못했었다. 현장에서는 민규동 감독과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크랭크인 전에 모든 합의점을 찾았다. 그래서 어린 여배우들에게 미안하더라. 다정다감하게 다가갔어야 됐는데 내가 힘들어서 못했다. 그리고 친한 게 연기에 썩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 돼지 장면은 정말 끔찍했다.
“돼지와 허벅지를 맞대본 사람이 누가 있겠나. 피부병 때문에 촬영이 다 끝나고 병원에도 다녔었다. 소, 말과도 찍어봤지만 돼지는 처음이었다. 돼지는 죽을 때까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른다. 안 죽으려고. 그런데 종자개량을 통해 살집을 늘리다보니 크기가 장난이 아니더라. 제작된 피라 달달하다보니 더 다가오는 것이었다. 밤새 찍었다. 때려도 봤다가 달래도 봤다가. 돼지들이 밤이 되면 눕는다. 나의 연기 따위는 필요 없었다. (웃음) 물릴까 걱정이었는데 다행이도 깨물지는 않더라.”
사진=서예진 기자 syj@zenithnews.com
저작권자 © 제니스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