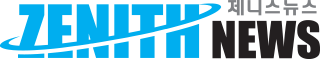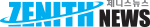[제니스뉴스=권구현 기자] 영화인이라면 가장 최고의 영예 중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칸국제영화제’ 진출이다. 배우 김옥빈은 영화 ‘악녀’를 통해 지난 5월 제 70회 칸국제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았다. 지난 2009년 박찬욱 감독의 ‘박쥐’에 이은 두 번째 칸 나들이다. 첫 경험 때야 어리바리 선배들을 따라다니기에 바빴겠으나, 이번엔 달랐다.
한 번으로도 영광스러울 자리를 벌써 두 차례 경험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라고 자부해도 될 지점이다. 그저 칸의 레드카펫을 밟았기 때문이 아니다. ‘박쥐’ 때와 달리 ‘악녀’는 김옥빈이라는 이름 석자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다. 김옥빈이 연기한 ‘숙희’는 차원이 다른 액션을 선보이며, 한국 언론은 물론 외신의 극찬을 받았다. 액션도 화려했지만, 여성으로서 이뤄낸 결과였기에 더욱 박수 갈채를 받았다.
제니스뉴스와 김옥빈이 서울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난 2005년 ‘여고괴담4’로 데뷔했으니 벌써 12년차 배우가 됐다. 이후 ‘여배우들’ ‘박쥐’ ‘고지전’ ‘시체가 돌아왔다’ ‘소수의견’ 등 평범하지 않은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김옥빈. 영화, 연기, 그리고 신작 ‘악녀’에 대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이 자리에 전한다.
칸에 다녀왔다. ‘박쥐’에 이어 두 번째다. 소감을 안 물어볼 수가 없다.
처음 칸에 갔을 땐 제가 너무 어렸다. 선배님들 따라 다니느라 바빴다. 뭘 알아야 그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텐데, 소중한 지도 몰랐고, 다시 칸에 가는 게 힘들다는 걸 몰랐던 것 같다. 덕분에 공항에 내렸는데 정말 처음 오는 것처럼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단지 기억나는 건 뤼메에르 극장과 레드카펫이었다. 처음 왔을 땐 그 레드카펫이 엄청 길고 넓었던 기억이었다. ‘대체 이게 언제 끝나나’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 그 길이가 짧아 보였다.
칸에서 영화를 처음 봤다. 완성된 ‘악녀’는 어떤 느낌이었나?
영화제에 가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보여달라고 정병길 감독님을 졸랐었다. 절대 안 보여주셨다. 이유를 나중에 물어보니 “서프라이즈”라고 하셨다. 기대만큼 좋은 영화가 나온 것 같다. 사실 자신의 영화를 처음 보면 본인 연기만 보인다. 두 번을 봤는데, 몇 번 더 봐야 할 것 같다.

‘악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바로 액션이다. 몸 만드는데 고생을 많이 했겠다.
칸에 온 외신들도 액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처음 보는 시퀀스”라는 평도 있었다. 덕분에 감독님이 슈퍼스타가 되셨다. ‘악녀’를 촬영할 때 정말 누구보다도 몸이 탄탄했다. 그런데 지금은 물렁살로 변했다. 하하. 몸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서양 배우와는 차이가 있다. 근육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지 않았다.
핵심적인 액션 시퀀스는 FPS를 차용한 오프닝, 오토바이 체이싱, 버스 엔딩신, 세 가지 시퀀스다. 가장 힘들었던 신은?
엔딩이 가장 힘들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했다. 테이크도 여러 번 갔다.
대역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나?
영화 전체에서 대역은 거의 없었다. 제가 해야 할 연기는 대부분 스스로 했다. 감사할 따름이다. 아무래도 대역이 하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은 완성도면에서 차이가 있다. 거기에 제 욕심도 있었다. 제가 액션 영화를 찍는데 “남이 해줬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공중에서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린다던가, 폭발신 같은 경우엔 스턴트 배우께서 해주셨다. 다시 한 번 그분들께 감사드린다.
고생이 많았는데, 다음 작품도 액션 장르가 들어온다면?
오히려 ‘악녀’보다 더욱 강렬한 액션을 해보고 싶다. 힘들게 배운 것들이 너무 아까운 것 같다. 하하. 액션도 쉬다보면 퇴화한다.
강렬한 액션도 좋지만 선이 예쁜 액션도 어울릴 것 같다.
좋다. 개인적으로 ‘와호장룡’을 좋아한다. 그런 아름다운 액션도 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다.
정병길 감독이 액션만큼은 알아주는 감독이다. 반면 드라마 부분을 찍을 땐 어땠을까?
감독님의 액션은 무자비한데 사실 굉장히 샤이한 분이다. 본인의 그런 성향을 영화 속에 녹여낸 것 같다. ‘악녀’의 멜로는 마치 첫사랑처럼 그려진다. 그런 지점이 바로 감독님의 샤이한 내면이다.
사실 감독님이 디렉션이 많은 분이 아니다. 배우에게 맡겨주는 분이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했다. 계속 “좋다”고 하시는데, ‘진짜 맞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연기에 있어 배우를 믿어준 부분은 정말 감사했다.

성준 씨와 멜로 호흡을 맞췄는데.
진짜 괜찮은 배우였다. 준비도 많이 해왔고, 애드리브도 웃긴 게 많았다. 설렁설렁 허술하게 놀러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었다. 또 리허설 할 때 상대를 배려하는 게 몸에 베어있었다.
미혼의 입장에서 아이 엄마를 연기했다.
시나리오 단계에서 제게 아이에 대한 부분은 크게 와 닿지 않았다.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이다. 김연우 양을 만나서 처음 연기를 하는데 ‘아뿔싸’ 싶었다. 영화 속 숙희에게 은혜의 존재는 굉장히 큰 부분이다. 그런데 그 지점을 놓치고 간 거다. 덕분에 고민이 많았다.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주변 분들에게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를 물어보며 캐릭터를 잡아갔다.
이번 ‘악녀’도 그렇고 지난 필모그래피를 보면 결코 호락호락한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가 아니다.
제가 봐도 독특한 필모를 쌓아가는 것 같다. 그래도 데뷔는 청순하게 했다. 하하. 제가 강렬한 작품을 좋아한다. 제 매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이 좋다. 멜로 같은 장르는 괜히 부끄럽고 민망하다. 그리고 남자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 보다는 진취적인 스타일의 여성을 좋아한다. 그 동안은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을 해왔다.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고 신나는 작품을 하고 싶다. 그래야 연기할 때 더욱 기분 좋게 할 것 같다.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동생 채서진 씨는 또 다른 분위기다. 이번에 멜로 영화를 찍기도 했다.
동생이 겉으로는 굉장히 청순한 느낌이다. 어렸을 때부터 둥글둥글하고 여성스러웠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강하다. 외유내강 스타일이다. 혼자서 여행도 잘 간다. 여성스러우면서도 안은 단단한, 그래서 부럽다. 저랑 반대다. 전 센 이미지가 있지만, 제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막내 같고, 막내가 언니 같다고 한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작품은?
어릴 때부터 몸 쓰는 걸 좋아했다. 또 배워놓은 액션도 아깝다. 그래서 스포츠 영화를 해보고 싶다. 음악 영화도 해보고 싶다.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영화면 좋겠다. 운동이나 음악, 모두 노력이 바탕이 되는 작품이다. 저는 고생하고 노력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다.
사진=하윤서 기자 hays@
저작권자 © 제니스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