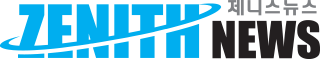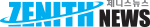[제니스뉴스=최민지 기자] 배우 김윤석(45)이 주는 힘은 상당하다. 그저 ‘김윤석’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영화를 선택하는 이유가 된다. 그런 그가 손을 내민 작품이 바로 영화 ‘극비수사’(곽경택 감독, 제이콘컴퍼니 제작)다. 형사 역할을 그리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형사 냄새가 물씬 나는 김윤석. 그래서 ‘극비수사’ 속 그의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다.
이 작품은 1978년, 부산에서 벌어진 유명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사주로 유괴된 아이를 찾은 형사 공길용(김윤석)과 김중산 도사(유해진)의 33일. 김윤석은 극 중 아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공길용 역을 맡았다. 김중산을 믿지 않았던 공길용은 서서히 그를 믿게 되고, ‘소신’이라는 이름하에 수사를 펼쳐나가게 된다. 김윤석이 보여준 진정한 형사의 얼굴, 이토록 사실적일 수가 없다.
다음은 김윤석과의 일문일답이다.
- 어떻게 영화를 시작하게 됐나.
“실화라서 결말은 알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일이다. 말 그대로 극비수사였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모두들 결말만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몰랐다. 그래서 숨은 진실을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끌렸는지.
“지금껏 강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다. ‘극비수사’도 그랬다면 안했을 것이다. 시나리오를 읽어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정면 돌파를 하는 정통파였다. 드라마를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는 느낌. 담백하고 사실적인 느낌이 좋았다.”

- 평소 무속신앙에는 관심이 있었나.
“무속신앙에는 관심이 없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느낌 점은 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최선을 추구했구나’ 싶더라. 인정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웃음)”
- 캐릭터 구축을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썼나.
“공길용 형사는 가장 일반적인 형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공무원답게 자기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원칙이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소품 팀에 형사 수첩과 볼펜을 부탁했다. 볼펜으로 수첩에 적는 것이 아날로그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었다.”
- 실제 인물이 존재하기에 부담이 있지는 않았는지.
“만약 누군가의 전기였다면 엄청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하지만 관객들은 공길용 형사에 대해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도 모르지 않겠나 싶었다. (웃음) 영화의 초점이 재현이 아니라 새로운 드라마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딱 하나, 원칙주의자이고 기본 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것에 집중했다. 과거 인터뷰를 보니 ‘유괴는 범인 체포가 우선이 아니라 아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셨더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
- 아내로 나온 박효주와 티격태격하는 장면은 진짜 재미있었다.
“집 안에서 발에 붙은 때를 뜯는 장면은 내가 직접 제안했다. 어릴 때 많이 보던 모습 아닌가. 하하. 지금도 종종 그런다. 세면대 위에 발을 올려서 씻다가 넘어지거나, 그러다 세면대가 떨어지기도 하고... 왜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나. (웃음)”

- 또 본인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 있나.
“아, 공길용 형사의 아들이 그린 그림 있지 않나. 그 그림은 사실 내가 그렸다. 어릴 적부터 만화 그리는 좋아했다. 이소룡 세대에는 꼭 옆차기가 있어야 되고, 경찰이면 별이 있어야 됐다. 스케치를 해서 보여줬더니 곽경택 감독이 ‘윤석 씨가 그리죠’라고 하더라. 내가 아니었다면 미술 팀이 그렸을거다.”
- 부모의 입장으로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
“공길용 형사의 인터뷰를 보면 유괴된 아이가 33일 만에 돌아오는데 그동안 부모의 얼굴이 제일 힘들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정은 씨는 일부러 다이어트도 했다고 한다. 점점 말라가고, 얼굴도 새카매지고, 결국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당신 밖에 없다’고 하는데 마음이 어떻겠나. 서울에서도 빠지겠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 은주 집에 데려다 주이소’라는 한 마디에 무너지지 않나. 부모의 심정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 본인의 연기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하는지.
“연기에 대해 항상 만족은 없다.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내가 신성일 씨와 같은 세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요즘은 외모 이외에 ‘연기파’라는 말도 있지 않나.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난 것 같다. (웃음)”
- 앞으로 어떤 영화를 하고 싶나.
“그 당시 굉장히 히트를 했는데 얼마 안 되서 잊히는 영화가 있고, 흥행이 되지 않아도 기억이 되는 영화가 있다.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필모그래피를 봤을 때 부끄럽지 않다. ‘안전빵으로만 채우지 않았구나’ 싶다. 작품성과 흥행을 다 잡고 싶지만 실패하더라도 안전빵으로 가는 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 우물만 파면 마른다. 연기 역시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극비수사’도 수사 극이라는 패턴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다. 힘이 닿는 한 의미가 있는 작품들을 하고 싶다.”
사진=서예진 기자 syj@zenithnews.com
저작권자 © 제니스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