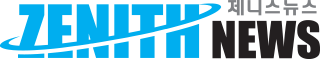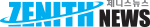[제니스뉴스=권구현 기자] 영화 '택시운전사' 속 '위르겐 힌츠페터'(토마스 크레취만 분, 이하 피터)는 낯선 이방인이었다. 택시를 몰고 그를 광주까지 태워가는 '만섭'(송강호 분)의 눈에는 그저 10만원을 안겨줄 부자 외국인, 속 된 말로 말하자면 '낯선 호구'였다.
하지만 외국에서 온 외신 기자 피터는 광주 시민, 그리고 우리 국민의 너무나도 반가운 희망이었다. 그리고 '택시운전사'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에, 그 희망의 불씨는 실제 우리 역사에서 불타올랐다. 기사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을 해외에 알렸던 이가 바로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다.
민주화를 위해 필연이었지만 아픔이 돼버린, 그래서 다시는 돌이키면 안 될 역사의 한 페이지다. 우리가 아닌 타인의 손을 빌렸기에 안타깝고, 그리고 그 시절을 아직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해 더 부끄러운 그때를 '택시운전사'는 그리고 있다.
그 낯선 이방인이자 희망 '피터'를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이 연기했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피아니스트'(2002)로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토마스 크레취만이다. 허나 그 유명 배우가 우리나라 영화에서 우리나라 배우와 호흡을 맞추는 장면은 너무나도 낯설면서도 반가운 모습이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개봉을 맞이해 한국을 찾은 토마스 크레취만과 제니스뉴스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진중하면서도 묵직했던, 하지만 여유와 위트는 차고도 넘쳤던 토마스 크레취만과의 만남을 이 자리에 전한다.
영화를 시작하기 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었나?
솔직히 말하면 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무지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주변에서 “어떤 작품을 하냐”고 많이 물었는데, 제 답변을 들었던 주변인들도 모두 모르고 있었다.
사실 그 정도로 거리가 먼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그런 곳의 영화를 촬영한 것은 어떤 기분이었나?
제겐 새롭고 이국적인 체험이었다. 저는 해외에서 외국인전문배우로 잘 알려져 있다. 제 삶의 목표가 ‘전 세계를 방문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배우는 최고의 직업인 것 같다. 다양한 나라의 감독과 배우를 만나면서 그들에 대해 알게 됐고, 문화를 체험했다. 전 그것을 좋아하고, 어딜 가든 쉽게 적응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어떤 어려움일까?
예상했던 것과 다른 체험이랄까? 무엇보다 언어적 장벽이 컸다. 다른 나라는 제가 언어를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감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글은 문장의 시작과 끝도 제대로 못 찾았다. 어느 나라나 리듬과 억양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도 있었다.
문화적인 차이라면?
한국은 문화적인 기반이 탄탄하고 통일성이 있는 나라 같다. 지금 같이 기자들을 만날 때 모두가 일률적으로 자판을 치는 것도 신기하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타이핑 하는 걸 처음 봤다. 참 이국적인 체험이다. 어쩌면 제가 아시아에서 작업을 많이 하지 않아서 더 생소했을 수도 있다. 일본이나 발리에 여행을 간 것 빼고는 아시아의 경험이 적다.

언어적인 장벽을 크게 느낀 건 역시 연기를 해야 했기 때문일 거다.
통역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저 때문에 흐름이 끊기는 경우도 생겼다. 많이 죄송했다. 모두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데, 저 때문에 느려지는 부분이 있었다.
정작 송강호 씨는 커뮤니케이션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저도 송강호와 연기하는데는 커뮤니케이션에 장벽이 없었다. 우리는 바디랭기지로 소통했다. 제가 말하는 언어적 장벽은 준비과정을 이야기한 거다.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갔을 일을, 저는 일일이 설명 들어야 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택시운전사’를 선택한 이유는?
대본을 보자마자 매우 좋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장훈 감독이 L.A까지 날아왔다. 배우 한 명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오는 건 쉽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 많이 감동 받았다.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
정말 심플하다. 대본을 읽고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싶은지 아닌지, 또는 공감이 되는지 아닌지, 혹은 연기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본다. 전 영화로 전하는 메시지, 또는 영화에서 펼치는 연기에 대한 욕심은 없다. 메소드 연기?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 느낌에 따라 직관적으로 연기하는 편이다.

이번 작품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최대한 자료를 많이 모아 읽어보려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료가 많지 않았다. 장훈 감독에게 다큐멘터리가 있는지를 문의했고, 그것을 많이 봤다. 유럽의 그 기자 분도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미 돌아가셔서 아쉬웠다.
조국인 독일도 정치적인 아픔을 겪은 나라다. 그때의 기억이 연기에 도움이 됐을가?
동독 탈출 경험은 인생에 있어 여러 도움이 됐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고, 제 배우 커리어에도 도움이 됐다. 그리고 세계관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전 제 조국의 대량학살을 그린 영화 ‘스탈린그라드’(1997)라는 영화에 출연했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경험이었다. 제 삶과, 제가 했던 작품 속의 경험을 토대로 ‘택시운전사’를 그려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런 경험보다도 한국 배우와 스태프들의 배려와 이해 덕분에 이 작품을 해낼 수 있었다. 특히 송강호가 많은 도움을 줬다. 그들의 세상에 날 초대해주고 안내 해줬다. 장훈 감독은 정말 예민하고 예리한 감독이다. 전체의 수장으로서 저를 잘 인도 해줬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의 영화 촬영 현장은 어떻던가?
스케줄이 변화무쌍했다. 날씨 때문이었다. 그래서 항상 이동했고, 마치 여행하는 기분이었다. 물론 배우보다 제작진들이 더 고생했을 일이다. 다만 전 외국인으로서 한국 제작 환경을 처음 겪기에 낯설음이 있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을 이해 못하고 작업을 한다는 건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번 촬영 현장에 박찬욱 감독이 왔었다고 들었다.
‘올드보이’ ‘박쥐’ ‘아가씨’ ‘스토커’ 등 박찬욱 작품을 많이 봤다. 특히 ‘스토커’의 색감은 너무 좋았다. 전 작품이 하나의 그림처럼 느껴진다. 한국엔 정말 훌륭한 감독이 많은 것 같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도 인상적이었다. 박찬욱 감독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난다. 제가 출연했던 영화 ‘피아니스트’의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다. 제가 그때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역시 기억이 안 난다.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인가보다.
사진=쇼박스
저작권자 © 제니스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