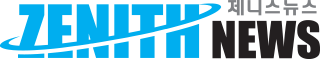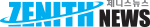[제니스뉴스=권구현 기자] 이병헌은 연기를 잘 하는 배우다. 아마 대다수가 공감할 이야기다. 그런 배우에게 많은 시나리오가 몰리고, 흥행이 예상되는 작품이 먼저 다가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병헌은 말한다. "흥행보다는 다양한 필모를 원한다"고.
어쩌면 대중 앞에 나서는 배우의 입 발린 소리일 수도 있다. 허나 이병헌이 배우로 걸어온 길을 되짚어본다면 그것은 입 바른 소리라는 걸 알 수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매그니피센트7'을 통해 어린 시절 서부 영화에 대한 로망을 살렸고, 알 파치노, 안드레 홉킨스와 협연만으로 '미스컨덕트'를 선택해 관객을 만났다. 시나리오에 호평이 자자했던 '싱글라이더'와 특별출연으로 이름을 올린 '밀정'도 같은 맥락일 터다.
그런 이병헌이 '남한산성'의 최명길로 돌아왔다. 병자호란은 우리 국민에게 있어 치욕의 역사 중 하나다. 하여 그 전말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꽤 있을 정도다. 많은 이가 쉬쉬하는 역사라는 것은, 어쩌면 영화로서는 약점 요소다. 또한 주화를 주장했던 최명길은 역사적으로도 외면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병헌은 최명길을 연기했다. 그의 호연 속에 우리는 최명길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됐다. 최명길이라는 인물에 새로이 숨을 불어넣은 이병헌과 제니스뉴스가 최근 서울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병헌이 말하는 '남한산성'과 '최명길', 그리고 영화 속에 담겼던 이야기를 이 자리에 전한다.

김윤석 씨와도 첫 작업이었다.
윤석이 형의 영화들을 보면서, ‘나랑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구나’ 같은 상상은 해봤다.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다.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었다. ‘윤석이 형과는 어떤 케미가 나올까?’라는 긴장도 있었고, ‘혹시 부대끼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있었다. 함께 하며 느낀 것은 나랑 결이 다르다는 느낌이었다. 정말 뜨거운 배우다. 아 또 하나, 목소리가 정말 크다. 연극 배우 출신 특유의 성량이 부러웠다.
이병헌 씨야 말로 목소리 좋은 걸로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배우 아닌가.
송영창 선배님도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신다. 연극 출신의 발성법을 배웠기 때문일 거다.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이다. 이번 영화 찍으면서 ‘내 목소리가 굉장히 작은가?’라는 생각을 했다. 전 이번 영화에서 ‘대사를 조금 더 크게 해달라’는 디렉션을 가끔 들었다. 김상헌이 직구를 날리는 캐릭터라면 최명길은 달랐다. 그 감정에 따라서 연기를 하다 보면 대사가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었다. 슬픔과 체념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마치 혼이 빠져나간 상태의 대사를 해야 했다. 그럴 땐 대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었다. 감정과 딕션의 중간에 서 연기를 해야 할 때가 있었다.
연기 호흡은 어땠을까?
이번 영화가 특이한 게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연기할 일이 없었다. 우리는 양쪽에 무릎 꿇고 인조를 바라보며 대사를 했다. 그래서 연기의 표정을 볼 일이 없다가, 영화에서야 확인을 했다. 특히 청나라 왕에게 답신을 보내느냐, 마느냐를 놓고 언쟁을 펼친 후 왕의 마지막 대사를 듣고 짓는 표정이 제 가슴에 많이 남았다. 사실 그 촬영을 할 때 윤석이 형이 정말 뜨거운 배우라는 걸 느꼈기에 더 그랬다. 윤석이 형이 그 촬영 때 NG가 몇 번 났다. 그분도 사극이 처음이기에 대사가 가끔 꼬였던 거다. 그때 자기 자신에게 정말 불 같이 화를 냈다. 그 열정이 대단했다.
이병헌-김윤석 연기야 믿고 보는 영역이고, 이번 영화에서 빛이 났던 건 고수 씨였다. 같은 소속사라 더 애틋하게 보였을 것 같다.
우리 수랑은 같은 소속사가 되기 전부터 관계가 돈독했다. 수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수도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는, 친한 형-동생 사이였다. 그런 고수가 ‘남한산성’에 캐스팅 됐다길래 “이 영화 선택한 거 너무 잘 한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정말 고수에게 좋은 필모그래피로 남을 것 같았다. 시사회 때 고수의 연기를 보고선 정말 기분이 좋았다. 또한 ‘황동혁 감독이 정말 잘 해줬구나’ 싶었다. 아마 고수도 여러 결의 연기를 펼쳤을 거다. 거기서 감독이 선택을 한 거다. 그것이 참 좋았다.

현장에서 특별히 힘들었던 부분은?
12월 중순부터 1월 말의 47일을 그리는 영화다. 정말 추웠을 그때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감독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 첫 신, 청군 사이로 제가 혼자 들어가는 신이었다. 정말 많은 인원이 그 신에 붙어 있었는데, 입김이 “많이 안 나왔다”며 다시 찍었다. 실내 촬영 때도 찬 기운에 입김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기 위해 3면의 문을 열어놓고 찍었다. 연기가 잘 나온 신, 입김이 잘 나온 신이 있다면 두 개를 놓고 갈등할 정도로 추위 표현에 심혈을 기울이셨다. 그래서인지, 영화를 보는데 참 추웠다. 하하.
추석 시즌 개봉이라 흥행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거다.
관객이 많이 드는 건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정말 좋은 영화였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좋다. 만약 그런 것들을 신경 쓴다면 ‘싱글라이더’ 같은 영화는 안 했을 거다. “이병헌 영화는 흥행해, 다 봐도 돼”가 아니라, “이병헌의 필모그래피엔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 골라 보면 돼”가 더 낫다.
언젠가부터 천만 영화가 흥행의 지표가 된 것 같다. 물론 천만 돌파는 축하할 일이지만, 약간 정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천만을 넘은 영화의 이야기와 이미지가 금방 휘발되는 것보다, 그것이 아니라도 계속 회자되고, 그 정서가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게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김은숙 작가의 ‘미스터 선샤인’ 이야기도 하자. 정말 오랜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다.
9년 전 ‘아이리스’ 이후 처음 하는 드라마다. 준비를 하나도 못 했다. ‘미스터 선샤인’을 선택한 것은 소속사의 손석우 대표가 정말 많이 설득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주변에서도 김은숙 작가에 대한 칭찬을 수 없이 들어왔다. 드라마는 작가의 예술이라고 한다. 누구나 전성기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세계에서 작가의 능력치가 최고조인 상황이다. 그걸 내가 연기해보면 어떨까? 싶었다. 그리고 할 거라면 내가 여력이 있을 때 해야할 것 같았다. 그렇다면 놀라운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사진=CJ엔터테인먼트
저작권자 © 제니스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