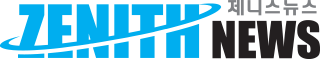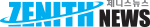[제니스뉴스=권구현 기자] 유호정이 ‘그대 이름은 장미’로 돌아왔다. 지난 2011년 ‘써니’ 이후 무려 7년 만에 복귀작이다. 유호정이 ‘그대 이름은 장미’를 선택한 것은 바로 ‘모성’이었다. 이미 슬하에 두 자녀를 18살, 15살까지 키워낸 유호정이다. 하지만 ‘그대 이름은 장미’ 속 모성애는 더 특별했다. 엄마 유호정이 아닌 딸 유호정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추억하며 연기했던 작품이었다.
‘그대 이름은 장미’는 지금은 평범한 엄마 ‘홍장미’ 씨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 그의 감추고 싶던 과거가 강제소환 당하며 펼쳐지는 반전 과거 추적코미디다. 유호정은 주인공 장미의 현재 모습을 통해 딸 현아(채수빈 분)를 키우며 성장하는 한 여성을 표현했다.
제니스뉴스와 유호정이 최근 서울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영화 ‘그대 이름은 장미’에 대한 감상부터,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연기와 육아의 사이에서 워킹맘으로 했을 여러 고민들까지, 여러 이야기를 들었던 시간이었다.
덕분에 오랜만에 따뜻한 영화를 만났다.
저 역시 몇 년간 갈증이 많았다. 들어오는 시나리오를 보면 유괴당한 딸을 둔 엄마,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엄마 같은 이야기들이 많았다. 그런 시나리오는 한 번에 보기 힘들다. 하지만 ‘그대 이름은 장미’는 따뜻했다. 행복한 모성애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제가 그동안 모성애를 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별로 없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엄마가 많이 떠올랐고, 엄마를 떠올리며 했고, ‘엄마가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간 엄마를 연기할 땐, 실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연기를 했다. 하지만 이 작품은 특별하게도 딸의 입장에서 우리 엄마를 떠올리며 연기를 했다. ‘우리 엄마도 그랬겠구나’ 하는 마음이었다. 엄마 마음에 공감하며 연기했다.
연기하며 울컥한 순간도 많았을 것 같다.
너무 많았다. 사실 연기자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관객의 몫으로 남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몰입해서 감정이 앞서 가는 신이 많았다. 그걸 절제하는 게 참 힘들었다.
특히 딸에게 쓴 편지는 내레이션으로 녹음을 한 거다. 그 녹음을 여러 번 했는데, 할 때 마다 울었다. 촬영 때도 많이 울었다. 친구 강자와의 관계를 그려내는 신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미안하다는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다.
딸 현아와 했던 모든 신은 투닥투닥 싸우는 신마저도 엄마 생각이 났다. 그리고 현아가 “엄마 호강시켜줄게”라는 대사를 들을 때 정말 울컥했다. 뭔가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땐 슬펐던 게 아니라 ‘장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주는구나’라는 생각에 울컥했다.

어머니와 함께 봤으면 더 좋았을텐데.
어머니께서 64세, 젊으실 때 가셨다. 10년 만 더 사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이 크는 것도 보셨으면 정말 좋았을 거다. 요즘 제가 연기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엄마한테 표현을 더 할 걸’이란 후회다. 참 무뚝뚝한 딸이었다. 어릴 땐 그걸 또 엄마 탓을 했다. 엄마가 혼자 딸 둘을 키우시다 보니 더 엄하게 하셨다. 사랑 표현도 안 하셨다. 한 번도 “우리 딸 예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사랑한다고 백 번씩 말해줘야지’라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이해가 된다.
워킹맘으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다는 갈등과 항상 부딪혔을 텐데.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남편의 이해와 외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제가 작품을 할 땐 남편이 쉬고, 남편이 작품할 땐 제가 쉬었다. 덕분에 현장에 있을 때 제 부담이 적었다. 전 그래서 결혼을 적극 추천하는 편이다. 현장에서도 “결혼 안 한 애 누구누구 있니?”라며 엮어주려고 한다.
지금 아이들이 이제 15살, 18살이다. 아들은 이제 체격을 시작으로 뭐든 저보다 더 커졌다. 딸도 저보다 크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다. 곧 제 품을 떠날 나이다. 주변에서 “아이들 크는 거 잠깐이다. 힘들어도 그때가 좋다. 그때를 즐겨라”라고 했는데, 이해가 된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속상할 일도 있고, 엄마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 곧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거다. 그래서인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 아이들의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더 함께하고, 더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작품이 끝나면 여행가고, 파티도 해준다. 그래서 그런지 그 기대 때문에 제가 작품을 할 때 많이 섭섭해 하진 않는 거 같다. 그럼에도 분명 약간의 서운함은 있다. 딸에게 “엄마가 놀아주니까 뭐가 좋아?”라고 물어보면 놀이공원, 찜질방 같은 곳을 같이 못 가본 게 옛날엔 참 부러웠다고 했다. 그럴 땐 가슴이 짠 해진다.
‘그대 이름은 장미’ 촬영 때도 김장을 병행 했다고 들었다.
정말 토할 뻔 했다. 40~50포기 정도 했다. 평소에도 김장을 한다. 동생도 오라 하고, 사촌도 오라 하고, 같이 해서 나눠먹고 싶다. 예전엔 친정엄마, 시어머님께 얻어 먹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엄마 김치를 먹고 싶었다. 그때부터 해먹고 있다. 1년에 하루, 연말 파티처럼 해먹고 잇다. 다만 그날은 정말 힘들었다. 김치통을 잔뜩 쌓아놓고, 감독에게 사진 찍어 보냈다. “새벽까지 날 붙들어 놓더니, 난 이러고 있다”며 불평했다.
우리 사회에서 김치는 결국 엄마의 향기다. 그런 의미에서 ‘그대 이름은 장미’가 더 와닿는다.
엄마를 추억하기 가장 좋은 것이 음식인 것 같다. 사람에게 가장 오래 남아 있는 감각이 미각인 것 같다. 저희 엄마도 “엄마가 해주셨던 그게 정말 맛있었는데”라며, “그 맛은 도저히 못 따라간다”는 말을 많이 하셨다. 그걸 이제야 알 거 같다. 아이들에게 밥을 많이 해줘야겠다고 여러 번 다짐했다. 일 없는 동안 만큼이라도 엄마 밥을 많이 해주려고 한다. 우리 남편도 그렇다. 아무리 잘 챙겨줘도, 가장 좋아하는 건 먹을 거 해줄 때다. 대단한 걸 해주는 것도 아닌데, 주스 하나를 갈아줘도 참 좋아한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저작권자 © 제니스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