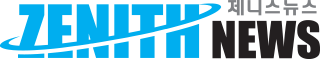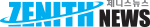[제니스뉴스=권구현 기자] ‘터널’은 한 남자가 터널이 무너지는 재난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생존해 나가는 사투를 그린 영화다. 비좁고도 어두운 공간, 그 속에서 홀로 여유롭게 빛나는 이가 있으니 바로 배우 하정우다.
재난 영화라 하여 무거울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구조를 기다리는 ‘정수’는 낙천적이며 여유가 넘친다. 그 모습이 하정우란 배우가 가진 본연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보는 이가 즐겁다. 말 그대로 하정우만 해낼 수 있는 연기다.
물론 이후 변해가는 상황 속에 ‘정수’의 감정은 크게 요동친다. 그 너울을 그려내는 것 또한 하정우이며, 왜 관객들은 하정우라는 배우에게 신뢰를 보내는 지 다시 한 번 곱씹을 수 있는 연기를 펼쳐낸다.
누구보다 똑똑하고도 뚝심있게 자신의 길을 가는 하정우를 제니스뉴스가 만났다. 배우부터 연출까지 넘나드는 하정우이기에 그와 나누는 ‘터널’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었다.
특히 영화 요소요소에 포진시킨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때가 특히 그랬다. 누구나 인정하는 달변가답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만큼 오프 더 레코드도 많아 기사로 다 써내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그 시간들을 이 자리에 전한다.
해석의 문제, 이번 ‘터널’에도 참 여러 입장들이 등장한다.
예수정 선배님이 두나에게 달걀 세례를 퍼붓는 장면을 보면서 각자의 입장이 있다고 봤다. 정말 양쪽 다 이해가 된다. 두나 씨가 “죄송합니다”를 두 번 하니 이야기가 멈추고 그 뒤에 예수정 선배가 달걀을 땅에 던지고 주저 앉는다. 그분도 사실 두나의 잘못도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다. 두나의 “죄송합니다”라는 말처럼 더 큰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해해야 하는 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
다른 입장을 다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악을 연기한 적도 있었다.
‘추격자’ 땐 인물을 이해하는 건 아니었다. 그냥 판타지일 뿐, 번외의 문제다. 하지만 제가 했던 사실주의 영화들 ‘멋진 하루’ ‘비스티 보이즈’ ‘러브 픽션’ ‘범죄와의 전쟁’ 등 그런 작품들을 보면 선과 악을 구분해서 표현하기 보다는 그 캐릭터를 이해해서 관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만드는 걸 더 고민하게 된다. 철저히 배우 입장에서 보면 캐릭터라는 것은 재미를 위해서 쓰이는 기능적 도구다. 거기서 선과 악, 도덕적인 문제에 걸린다면 한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다른 대답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같다. 달수 형의 “눈물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건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영화에서 만나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이해심이 많아진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눈물이다. 말도 안 되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으면 웃을 때도 눈물이 나온다는 게 이해심의 찌꺼기 같다. 저도 요즘엔 웃을 때 눈물이 난다. 물론 그냥 저만의 생각이다.

데뷔 때보단 이해의 폭이 확실히 넓어졌나?
30대를 돌이켜보면 10년간 나만을 위해서 달려왔다.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사랑 받기 위해, 내 삶을 위해 살았다. 내 삶의 주인은 나였다. 하지만 이제는 어쩌면 내 삶의, 배우 하정우의 삶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 같다. 다른 주주는 관객이 될 수 있고 팬이 될 수도 있다. 지분이 점차 나뉘어지는 느낌인 것 같다. ‘아가씨’ 때도 어쩌면 ‘암살’ 때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다. 내 자신을 위해 작품을 선택하는 것도 맞지만, 그 작품이 감독의 것도 맞지만, 관객이 즐겨야 그 가치가 인정되고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내가 도움이 되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이었으면 이번 ‘터널’처럼 많은 의견을 못 냈을 거다. 옛날엔 눈치를 많이 봤다. 아이디어를 내는 게 감독의 작품 영역에 예의가 어긋난다 생각했다. 이번엔 처음부터 감독님에게 “제 아이디어 중에 쓰실 거 있으시면 바로 사용하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모든 걸 여과 없이 뱉을 거고 취사선택 하시라고 했다. 우리의 대의는 관객을 위한 영화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다. 데뷔 초보다는 그럴싸하게 설명할 만한 능력이 생긴 것 같다.
관객을 위한 영화, 참 열심히도 찍는다. 진정 다작하는 배우다.
연평균 세 편이란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다. 어떤 해엔 세 편을 찍었을 뿐이다. 아직 미혼이라 가능한 거 같다. 얼마 전 맷 데이먼이 인터뷰 중에 “1년 간 쉬겠다”라고 했다. ‘왜 쉴까?’라는 생각을 했다. 저보다 8살 많은 70년 개띠 형이다. ‘굿윌헌팅’ 때부터 달려왔는데 이제서야, 49살에 쉰다 그러니 의아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젊을 때 가족과 추억을 쌓고 싶다는 이유였다. 요즘엔 맷 데이먼에게 가장 큰 가치가 가족이었던 것 같다. 저도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쉴 생각은 있다. 하지만 지금 제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화를 찍는 거다.
고생해서 찍은 작품인데, 다음 번에도 감독님이 같이 하자고 한다면?
작품 보고서 판단할 거다. 배우로서 그 캐릭터가 어울리고 그 작품에 도움이 된다면 하겠다. 모든 영화가 다 고생이다. ‘신과 함께’도 뙤약볕에서 찍고 있다. 긴 바지에 롱자켓을 입고 찍는다. 감독은 끊임없이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촬영 때 누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은 감독인 것 같다. 거기서 벌어지는 육체적, 창작의 고통은 늘 익숙하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할 부분이 없다.
사진=하윤서 기자 hays@
저작권자 © 제니스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