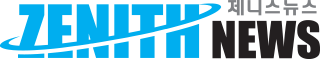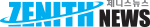[제니스뉴스=권구현 기자] 졸지에 ‘돈’을 좇는 배우가 됐다. 진짜로 돈에 집착하는 배우라는 말은 아니다. 영화 ‘돈’에 출연한 배우 조우진의 이야기다. 하지만 영화 ‘돈’에서 조우진이 연기한 한지철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돈을 좇는 군상들을 잡으러 다니는 인물이다. 사실 돈의 사리사욕에 대해서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돈’을 좇는 배우라 말한 건 전작 ‘국가부도의 날’에서부터 유독 큰 돈에 관련된 영화에 출연했기 때문이다. 영화야 서사를 띤 예술이고, 인간사에 돈이 빠질 일이 없기에 당연히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돈이다. 허나 그처럼 돈의 흐름 위에 서있는 국가 공무원을, 그것도 정반대의 입장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선 보인 배우도 드물다.
하지만 조우진은 돈을 쫓(아내)는 배우다. 오는 돈을 마다하지 않겠지만, 자신의 노력에 비해 과한 돈을 경계하고 돈보다는 사람을 좇는 배우이길 다짐하는 연기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우진의 연기를 좋아하는 지도 모른다. 그의 연기에선 항상 진정성이 느껴지고, 사람 냄새가 풍긴다. 하여 악플 없는 배우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을 거다.
최근 할리우드 공습 속에서도 꿋꿋하게 한국영화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영화 ‘돈’의 조우진과 제니스뉴스가 서울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사람 냄새가 너무나도 좋았던, 그리고 연기에 대한 소신이 너무나도 듣기 좋았던 그 시간을 이 자리에 펼쳐본다.
영화를 보자마자 궁금했다. 현장에선 누가 가장 돈을 잘 썼는지?
아무래도 유지태 형님이 큰 형 노릇하셨다. 돈 긁는 거, 즐겨 하신다. 하하. 촬영 없어도 자주 현장에 나갔다. 파이팅도 하고, 끝나면 으쌰으쌰 밥도 먹고, 술도 한 잔 했는데, 오히려 그때 더 많이 마주한 거 같다. 사실 촬영으로는 엔딩의 지하철신에만 마주한다.
제목 따라 가는 영화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돈’이 돈을 벌고 있다.
대놓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흥행과 함께 봄을 맞이하고 싶었다.

‘돈’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결 같다. “재미있다. 몰입이 잘 된다”는 평이다.
저 역시 영화가 힘이 넘친다고 생각했다. 끝까지 한번도 놓치지 않고 쭉 가는 게 좋았다. 재미와 작품성이야 관객들이 평가해주셔야 맞다. 누구나 그렇지만 저 역시 제 영화를 객관적으로 잘 못 본다. 보통 몇 번을 봐야 한다. 하지만 ‘돈’은 달랐다. 그게 참 놀라웠다. 힘이 끊어지지 않고, 최고조로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좋았다. 오랜만에 등을 좌석에 딱 붙이고 보게 됐다.
몰입의 주인공은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다. 우린 ‘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힘의 원천은 ‘돈’을 중심으로 한 케미스트리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돈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고가 다 다르다. 그게 얽히면서 이야기가 달라진다. 돈의 단위가 커지면서 카타르시스도 따라 올라간다. 분명 내러티브는 걷다 뛰고, 다시 걷고 하는데, 감정선은 계속 달려간다. 오랜만에 흠뻑 빠졌다.
이른바 판돈이 올라가는 셈이다.
돈의 액수가 끊임없이 언급된다. 몇 억, 몇십 억, 그 단위가 계속 올라간다. 관객이라면 조일현의 감정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거기서 ‘나한테 이런 돈이 생긴다면 어찌할까’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누구나 한번은 망상 속에 빠져봤을 거다. 이른바 ‘이번 주 내가 로또가 된다면?’에서 이어지는 망상이다. 조우진 씨도 해봤을 거다.
자기 노력 이상의 돈이라는 게 중요하다. 절대 혼자 쓰진 못할 거 같다. 다 나눌 거 같다. 웬만하면 좋은 일로 쓰고 싶다. 사람 마음이 노력보다 더한 수익이면, 헛되이 쓰여질 확률이 더 크다. 일현이도 돈 생기니 술부터 마시러 간다. 물론 집도 사고, 부모님께 잘 해드리지만, 결국 쿵짝쿵짝 음악부터 나온다. 아마 다들 비슷할 거다. 그런 것에서 오는 공감 코드도 있는 거 같다.

그래서일까? 분명 한지철은 정의의 사도인데 악역처럼 보인다.
일현의 대척점에 있다 보니, 악역처럼 보이셨을 수 있다. 일현은 어떻게 보면 돈에 지배되는 사회에 청량감을 제시한다. 그래서 한지철은 으깬 감자나 고구마처럼 답답해야 했다. 방해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해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다. 그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보일 것인가를 경계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도덕적인 잣대도 제시해야 하는 인물이라는 부담이 있었다. 전 돈을 바라보는 건 한지철의 시선이 가장 보편타당하다고 봤다. 그런 사람이 영화 속에도 필요했고, 영화 밖에는 더 많았으면 좋겠다.
‘국가부도의 날’에 이어 이번에도 돈에 관련된 공무원이다.
‘국가부도의 날’의 차관은 그 당시 경제의 판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힘을 가진 권력자다. 저야 그렇지 않은 소시민이니까 그 차이에서 희열을 느끼며 작업했다.
한지철은 정치인은 아니다. 사회적 기준 속에 감독과 감시를 하는 인물이다. 사실 그 속의 자존감에서 오는 우월감이 있을 것 같았다. 소신만 정확하다면 마음껏 표출해도 욕먹을 일이 없는 인물이다. 그 가치관에 빠져들다 보니 더 지독해졌을 거다. 아마 처음부터 사냥개는 아니었을 거 같다. 평범한 공무원이었지만, 범죄가 너무 지능화 되니, 자신도 변해갔을 것 같다.
최근 들어서 한 작품 중에 직업적으로 취재를 못했던 캐릭터 중 하나다. ‘마약왕’의 성강파 보스처럼 말이다. 금감원은 취재 요청을 했는데, 절차적으로 쉽지 않았다.
이번 영화를 찍다 보면 돈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을 것 같다.
아무래도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누구나 바라고, 누구나 갈구하는 게 돈이다. 그러다 보면 자기 노력보다 더한 돈을 바라보게 된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느꼈던 것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다. 아직까지 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까진 돈 보단 사람을 좇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배우는 아티스트이기도 하지만, 결국 돈에 얽매인 직업이기도 하다.
금전 논리가 분명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옛 성인, 그리고 어른들, 나아가 선배님들의 말씀이 다 틀리지 않다. 너무 많이 들어 고리타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돈은 따라 온다”고 했다. 그 말을 믿고 싶다.
극을 이끌어가는 것은 일현이다. 배우 류준열과의 작업은 어땠는지?
준열 씨하고는 많은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연기할 땐 준열 씨의 연기를 보면서 그때그때 반응하려고 했다.

그럼 후배 류준열과의 작업은 어땠을까?
준열이가 실생활에도 센스가 넘친다. 준열이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매력이다.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저의 경우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하다. 덕분에 많이 배웠다. ‘쟨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라며 그 상황을 메모해 놓은 적도 있다. 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몇 초간 생각을 해야하는데, 준열이는 바로 튀어나온다. 굉장히 센스 있는 친구다. 어떤 유형의 말이든 센스가 담겨있다. 그렇다 보니 그 사람의 비상함과 영리함까지 느껴진다.
현장에서 애드리브가 많았나 보다.
마냥 애드리브는 아닌, 그런 지점이 있다. 매 신에는 목표가 있다. 일단 신의 목표가 합의가 됐다면 현장성을 즐기려고 했다. 그래야 장면도 풍부해지고, 그 인물과 상대 배우와의 케미도 풍부해진다. 뭔가 입체적으로 구현되는 기분이다. 거기서 오는 보람이 상당하다. 작품과 인물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열어놓고 가는 편이다.
그만큼 ‘돈’의 촬영 현장이 열린 현장이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대화를 하면 피드백이 굉장히 명료하게 왔던 현장이었다. 특히 감독님이 그랬다. 제가 포기가 빠르다. 촬영 전 대화할 때 “전 아쉽거나 섭섭해하는 편이 아니니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수진 감독님은 “대답 빨리 할 테니 마음껏 준비하세요”라고 하셨다.
전 감독님이 편집하실 때 기분 좋은 고민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연기자가 가지고 가야 할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런 걸 싫어하는 분도 계신다. 이수진 감독님은 많이 열어주셨다.
사나이 픽처스에 오랜 적을 둔 이수진 감독이다. 조우진 역시 사나이픽처스와 연이 있는 멤버다.
사나이픽처스는 ‘보안관’ 때부터 함께 했다. 이번 ‘돈’ 역시 ‘사나이픽처스와 함께 작업하면 정말 행복하다’는 게 작품 선택의 큰 이유가 됐다. 사나이픽처스는 연기에만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힘, 잘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 작품에 참여하는 구성원에게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크게 고취시켜주는 제작사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땐 사나이픽처스만의 패밀리십이라 말하는 것 같다. 다만 사나이픽처스의 패밀리십은 고인물과 같은 자신들만의 패밀리십이 아니다. 함께 흘러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제작사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일례로 입봉 하는 감독 영화에 이토록 힘을 실어주는 게 쉽지 않다. ‘돈’의 고사 때만해도 김성수 감독님, 정우성 형, 황정민 형 등 다 같이 와서 으쌰으쌰 해줬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저작권자 © 제니스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