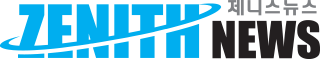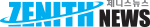[제니스뉴스=권구현 기자] 2014년 5월 16일 서초동 주택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사건이 생긴 지 1년 후, ‘고동호’(손현주 분)에게 살해 당했던 아내 ‘조연수’(엄지원 분)의 전화가 걸려온다. 과거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동호’는 바뀌는 과거에 따라 현재도 그에 맞춰 변화한다는 것을 깨닫고, 1년 전 그 날의 사건 속에서 아내를 구하기 위한 고군분투를 시작한다.
시공간의 초월을 다룬 영화는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지만 그런 영화들의 장르 구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바로 ‘SF’ 또는 ‘판타지’다. 마냥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장르의 구분은 대개 그래왔다. 이를테면 2014년 개봉했던 ‘인터스텔라’는 물리학이나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론적인 4차원 이상의 고차원 세계를 구현했지만 결국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SF’ 영화다.
같은 잣대를 드리우면 영화 ‘더 폰’은 SF 영화다. 1년 전 강도에게 살해당한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아마도 태양의 흑점 폭발로 인한 전파의 오류로 추정된다. 어차피 허구이니 그 개연성이 중요하진 않다. 전화 통화를 통해 과거를 바꾸면 현재도 이에 맞춰 바뀌어 간다. 즉, 아내를 살릴 수 있다. 이보다 더 SF적인 설정은 없다. 하지만 ‘더 폰’은 SF가 아닌 추격 스릴러다. 그것도 아이러니 하게도 ‘리얼함’에 모든 힘을 쏟은 스릴러 영화다.

영화의 허구적 설정은 핸드폰의 벨이 울릴 때 시작되며, 통화를 마치면 끝난다. 전화를 끊은 ‘동호’와 ‘연수’가 마주하는 곳은 현실이다. 그것도 살해의 위협을 당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스릴러라는 장르의 특성상 관객들의 몰입은 필수다. 하여 '현실감'이 중요하다. 영화 ‘더 폰’으로 장편 데뷔하는 김봉주 감독은 신인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더 폰’에 현실감을 유지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배우들의 호연이다. 특히 그 중심엔 손현주가 서 있다. 김 감독이 “손현주 배우가 지닌 리얼리티는 어떤 이야기라도 현실감을 부여하는 힘이 있다”고 언급한 건 괜한 칭찬이 아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내 주변의 이야기 같아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싶을 정도다.
손현주가 가진 그런 리얼함은 ‘숨바꼭질’(2013) ‘악의 연대기’(2015)에 이어 또 다시 스릴러 영화가 그에게 손을 내민 이유일 것이다. 빗 속에서 열연을 펼친 엄지원의 연기도 무리 없으며, 최근 많은 영화에서 감초로 얼굴을 비춘 배성우는 남달라진 분량과 함께 훌륭한 주연 연기를 펼친다.

더불어 영화 속 등장하는 서울의 랜드마크 또한 현실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다. 광화문, 청계천, 종로, 을지로 공구 골목, 강남 뱅뱅사거리 등 우리가 생활하며 거쳐갔을 법한 거리들을 영화 속에 담았다. 매 년 ‘부처님 오신 날’이면 서울에서 열리는 ‘연등 행사 행렬’을 추격전 속에 넣은 것 또한 묘수였다. 그 거리에서 펼쳐지는 달리기, 혹은 자전거 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맨몸 추격씬은 관객들의 몰입과 함께 긴장감까지 더한다.
‘더 폰’은 꽤나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하지만 시공간을 넘나들었어도 결국 이야기는 꽤나 단순한 구조. 따라서 영화를 따라가는데 큰 무리는 없다. 더불어 스릴러라고는 하지만 수위가 높지 않아 장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관객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영화 ‘더 폰’은 오는 22일 개봉한다.
사진=영화 '더 폰' 스틸
저작권자 © 제니스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