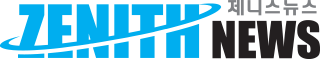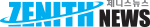[제니스뉴스=권구현 기자] 연기본좌, 정말 배우로서 황송하지만 누구나 탐낼 만한 호칭이다. 이 호칭으로 불리는 이름이 있고, 그 어떤 사람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 주인공이 바로 김명민이다.
그를 만나본 이라면 누구나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관리의 화신”이라는 것이다. 언론시사가 끝난 후 열렸던 기자들과 술자리에서도 적당량만 마시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줬다.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언론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어딘가 차갑지 않을까? 아니다. 김명민은 항상 여유롭다. 이미 여러 상황에 많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다. 그 연장선에서 그는 작품에 들어간다. 하여 우리는 김명민의 연기에 신뢰를 보낸다.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연기자, 그것이 바로 김명민이다.
최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배우 김명민을 만났다.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로 브라운관을 호령한 후 스크린으로 돌아온 김명민. 이번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에서는 전직 경찰이자 지금은 변호사 사무장인 브로커 ‘필재’를 연기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녹취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여유. 영화를 본 이라면 대번에 알아챌 ‘녹취’라는 키워드에서 기분 좋게 인터뷰를 시작할 수 있었다.
긴 호흡의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를 끝내고, 다시 영화로 돌아왔는데 소감이 어떠한지.
매번 똑같다. 오랜만에 뵙는 거긴 하지만 드라마로도 인사를 계속 드렸다. 아예 휴식을 하다가 노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본다. 드라마나 영화나 구분하진 않는다.
기술시사 때 영화를 보고 마음에 들어했다 들었다.
기대했던 거보다 좋았다. 상호 형이나 저나 기대를 많이 안하고 봤던 것 같다. 당초 ‘재미 없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버리자’라고 했다. 그런데 상호 형이 “좋다. 재미있다” 했다. 낮 12시부터 6시까지 낮술을 먹었던 것 같다.

작품 선택의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
일단 재미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할 것이 있어야 한다. 요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작품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와 빵빵하다. 투자배급도 좋고, 감독도 좋고, 내용도 좋다. 누가 봐도 흥행 보장. 그런데 재료는 두 세 개 정도가 있어, 내가 하나 남이 하나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 역할이다. 반대로 또 하나는 얘보다는 힘든 작품이다. 투자도 될까 말까 하고 감독님도 입봉 감독님이다. 게다가 난해해. 크게 상업적인 영화는 아닌데 일단 만들면 부끄럽지 않을 영화다. 그런데 역할에 열댓 가지 재료가 남아있다. 그러면 전 후자를 택한다.
분명 흥행만 바라보고 작품을 고르는 배우는 아니다.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않으면 만족 못하는 스타일이다. 돈 많이 벌고 흥행되면 물론 좋다. 하지만 그것에서 오는 공허함은 제가 가는 배우의 길과는 다른 부분인 것 같다. 제가 천년만년 배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가 했던 필모그래피에서 남부끄럽지 않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흥행에 성공 못했더라도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 있고 배우로서의 성취감이 있다. 그게 저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다.
그럼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에서 주어진 재료는 무엇이었나.
나름 다양한 재료들이 놓였다. 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저와 관련되어있는 캐릭터들이 유기적으로 끈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관계성이라는 부분이다. 그 관계들이 작위적이지 않게 잘 그려졌다. 캐릭터 플레이를 보는 맛도 한 몫 할 거 같다. 어떤 배우들이 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의 시나리오라면 전혀 고사할 필요 없을 것 같았다. 결국 캐스팅이 잘 됐다.

맞다. 이 영화는 필재가 죽 걸어가고 있으면 다른 캐릭터들이 돌아가며 다가온다. 그런데 그 배우들이 다들 한 연기하는 분들이다. 성동일, 박혁권, 김뢰하, 김영애, 거기에 신구 선생님까지. 말 그대로 쟁쟁하다.
틈틈이 에너지를 보충하고 가는 느낌이었다. 누수가 없다는 것이다. 제가 조금 실수를 해도 여러 사람들이 막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제 마음 속에 준비하고 간 부분이 전체의 50%다. 나머지 50%는 그 분들로 인해 채워졌던 것 같다.
결국 좋은 배우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시나리오의 힘이었을까?
그럴 거라 생각한다. 일단 시나리오는 완성된 영화하고는 조금 달랐다. 영화는 시나리오보다는 조금 가볍게 리터치 됐다. 시나리오는 묵직하고 무게가 있었다. 안 좋게 이야기하면 어두웠다.
소재의 모티브가 됐던 부분, 영남제분 며느리 사건이 가벼울 리 없었다.
맞다. 실제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을 베이스로 깔고 있다. 하지만 영화는 그 소재로 중심을 잡고 나머지 부분들을 가볍게 만들어냈다. 덕분에 극이 경쾌해진 것 같다. 그래서 홍보 초점도 경쾌 통쾌 수사극으로 맞췄던 것 같다.
아니다. 홍보 초점은 ‘아재들’로 맞춰져 있다.
아재는 빼줬으면 좋겠다(웃음). 같이 묶이기에는 좀 억울하다. 저의 의견이 아닌, 그렇게 말해주시는 기자님들이 분명 계셨다(웃음). 물론 아재 코드가 요즘 트랜드에 맞으니까 그 전략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나름 뜬금없는 유머 코드가 이 영화에는 있다는 게 작품의 핵심 포인트 같다.
애드리브도 많았지만 대본 상의 유머 코드도 많았다. 예를 들면 성동일 형님에게 말하는 “개장수” 드립은 애드리브가 아니다. 또 편집될 뻔 하다가 내가 강력히 주장해서 다시 넣은 신도 있다. 양 형사 집에 들어가서 반장님과 성동일 형님이 주고 받는 원숭이띠, 두 사람이 나이가 같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그 심각한 상황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틱틱 성동일 선배랑 농담을 날릴 수 있는 것이 저희 영화의 핵심 포인트다. 정말 감독님에게 끝까지 우겨서 들어갔던 대사다. 그거 빠졌으면 어쩔 뻔 했나(웃음).
▶ 2편에서 계속(클릭)
사진=하윤서 기자 hays@
저작권자 © 제니스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